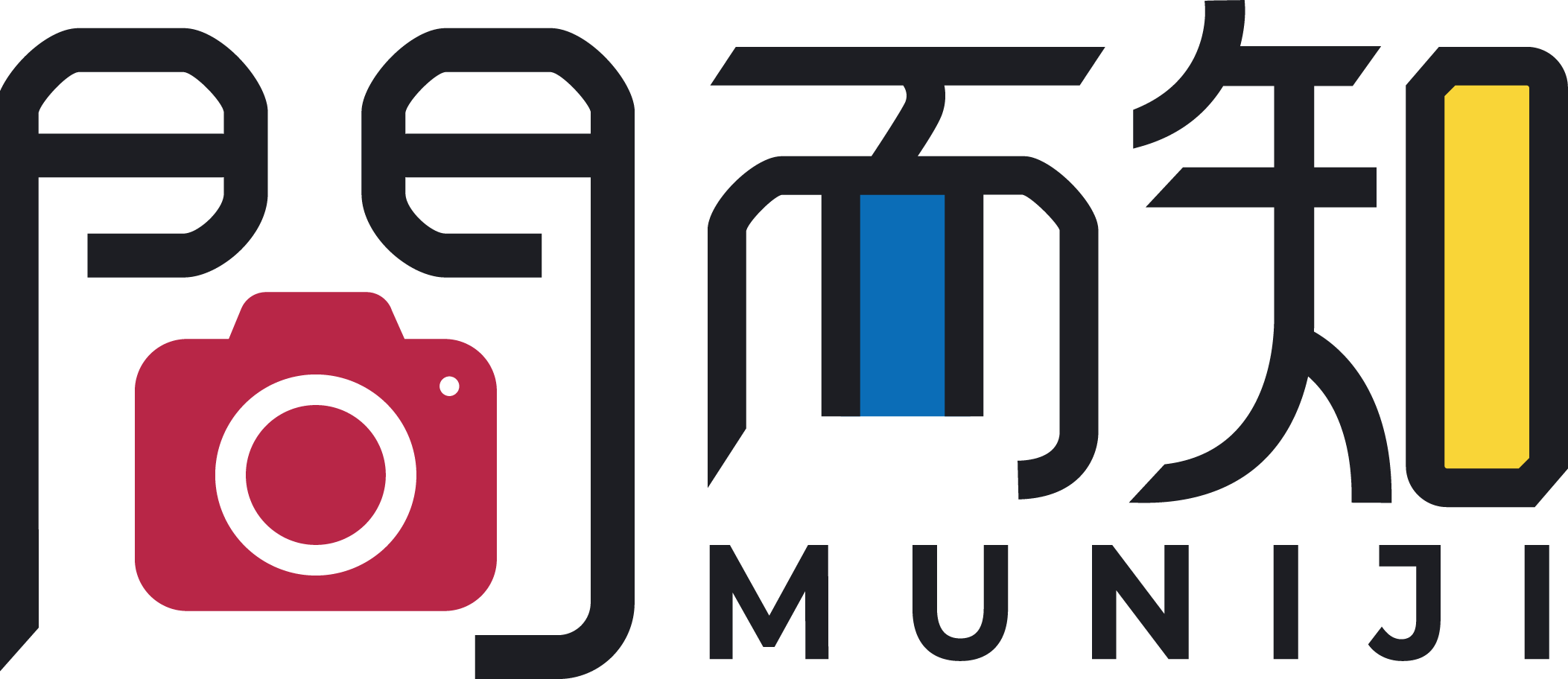따뜻한 날에는 곧잘 자전거를 타던 남편이 겨울에도 즐길거리를 만들어보자고 하여 작년부터 같이 스키를 배워 타기 시작했다. 예전에 “젊음은 보드지!”라는 생각으로 몇 번 타다가 언젠가 한 번 대차게 넘어진 후로 ‘돈 써가며 춥고 고생스럽게 몸까지 다칠 필요는 없지.’ 싶어 발길을 끊은 지가 이미 몇 년이 되었다. 그러나 망각의 축복으로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희미해진 덕에 겨울 스포츠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나이 들어 타기는 스키가 좋지!
주로 갔었던 곳은 횡성의 웰리힐리 스키장이었는데, 남편이 어디선가 이용객이 적어 ‘황제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 왔다. 경영이 어려워 몇 년 동안 시설투자가 되지 않았던 데다가 바로 근처에 하이원이라는 훌륭한 스키장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비운의 오투리조트이다.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늘한 지역인 태백에 있어서 우리도 여름휴가 때 몇 번 찾았던 곳인데 그때도 시원하고 한적하다는 것 외에 기타 부대시설의 매력은 찾기 힘든 곳이긴 했다. 물론 우리는 그 시원함과 한적함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곳을 찾았었지만.
과연 스키장이 잘 운영되고는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성수기 주말의 한적한 스키장’의 실존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가보기로 했다. 성수기 토요일 숙박을 이틀 전에 무리 없이 예약하고 보니 ‘한적함’은 일단 사실인 듯 보였다. 우려를 안고 먼 길을 달려 도착한 스키장은 절반의 슬로프만 열려있고 조명이 어둑어둑하긴 했지만 다행히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장비를 빌렸는데 스키 부츠도 옛날 방식으로 정강이만 조이는 형태라 발이 좀 헐거워 영 불편했다. 성수기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지만 웰리힐리 스키장의 평일 수준보다 조금 더 한가한 느낌. 황제스키를 즐길 때가 온 것인가.

오투리조트의 스키장은 처음 온 곳인 만큼 안전제일주의자로서 초급 슬로프를 먼저 올라가 보았다. 한 번 타고 내려오니 눈 위에서 미끄러지기만 해도 놀라는 사람들을 배려한 설계를 한 것인지 절반이 넘는 거리가 거의 평지와 다름없는 경사였다. 초급자가 아닌 초심자용이라고 일부 구간을 따로 이름 붙인 이유가 있었다.
그래도 그간 스키를 몇 번이나마 타본 경력으로 보아 내가 여기 있을 실력은 아니지 싶어 자신만만하게 중급 슬로프를 올라갔다. 그런데 ‘자연이 만든 야생스키장’이라는 리조트의 슬로건에 걸맞은 야생의 눈은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고, 부츠 안의 헐거운 발은 앞으로 자꾸 밀려 발가락이 아파서 그동안 연습했던 동작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저 넘어질까 걱정되어 아등바등 A자만 열심히 만들면서, 행여 속도가 붙을까 안절부절못하며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바닥을 스키로 박박 긁으면서 내려왔다. 이 코스의 자랑인 3.2km에 달하는 긴 거리가 이때만큼은 살짝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대체 언제 다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전에 탔던 웰리힐리의 중급코스인 스타익스프레스와 경사가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오히려 폭은 더 넓어서 그렇게 겁을 낼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처음 타는 곳인 데다가 익숙하지 않은 장비 탓도 있었고, 잘 타면야 사람 없는 곳에서 즐기는 황제스키가 되지만 못 타는 사람에게는 조난스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한적함에 괜히 더 긴장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패트롤이 수시로 다니고 있었고, 잠시 멈춰서 있다 보면 혹여나 겁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하며 물어봐주셔서 몇 번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어요.”라며 안심시켜드려야만 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한 번 고생했다고 자신감이 조금 올랐다. A자만 잘 만들면서 내려가면 적어도 크게 굴러 넘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됨을 경험했으니,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스템턴까지 잔재주를 부려본다. 그러다 눈 무더기에 스키가 걸려 철퍼덕 넘어지기도 하고. 자연설이라 눈이 폭신폭신하니 넘어진 김에 쉬어가기는 괜찮았다. 그렇게 다시 내려간 3.2km는 처음과는 달리 충분히 연습을 하기에 좋은 거리구나 싶은 생각도 얼핏 들었다.
세 번째 내려올 때 남편이 좋은 팁을 알려줬다. 턴 할 때 폴대로 바깥 스키 쪽을 찍어주면 자세를 낮추기도 좋고 안정적이라고. 바깥쪽이라고? 안쪽 아니었어? 어쩐지 자세가 부자연스럽더라니. 전수받은 팁대로 방향을 바꾸고 폴대를 같이 써보니 확실히 제어가 쉬워졌다. 자세가 안정되니 속도가 붙어도 전처럼 무섭지 않아서 제법 스피드를 즐기는 척 내려올 수 있었다. 물론 자세를 많이 낮추는 만큼 끊임없는 스쿼트 자세로 고통받는 대퇴사두근이 아우성이라 몸을 숙일 때마다 절로 으악 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음 겨울을 위해 웨이트도 신경 좀 써야겠네.
무엇인가를 새로 배워 익히는 과정은 즐겁다.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점점 익숙하고 잘하게 되는 과정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 있다. 물론 그럭저럭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또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능의 벽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선수를 할 것이 아니라면야 일반인은 그럭저럭 해내는 수준의 즐거움까지만 누려도 괜찮치 않을까. 해볼 만한 재밌는 일이 세상에 많은데 그 많은 일마다 재능이 있을 리는 만무하니 말이다.
昨夜江邊春水生(작야강변 춘수생)
蒙衝巨艦一毛輕(몽충거함 일모경)
向來枉費推移力(향래왕비 추이력)
此日中流自在行(차일중류 자재행)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니
큰 전함이 한 올 터럭처럼 가볍구나
이전엔 배 옮기는 힘 허비하였는데
오늘은 강 가운데 저절로 떠다니네
이 시를 그냥 보면 강 위에 떠있는 배에 대해 읊은 시인가 싶지만, 시 제목은 ‘배’도 ‘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책을 보고 느낌이 있어 읊다 [觀書有感(관서유감)]”이다. 시는 역시 제목을 함께 봐야 작자의 의중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 조선 선비들의 아이돌, 송나라 주희(朱熹) 선생의 시인데, 제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면 이는 독서를 통해 지식이 쌓일수록 심오한 이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을 비유한 시라고 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훌륭함은 정답이라는 것이 없는 데 있지 않았던가. 비단 심오한 이치에 이르는 일뿐 아니라 스키장 중급 슬로프를 세 번 오르는 일에 있어서도 울림을 주니 역시나 유명한 작품이 된 이유가 있다.
처음 이 시를 배우고서 동기 몇몇이 시가 좋다며 좋아했는데, 나는 낯선 ‘몽충’이라는 단어도 왠지 어감이 멍청이 같아 별로라는 몽충이 같은 생각도 들면서 ‘이 시가 좋아? 왜? 난 잘 모르겠는데.’ 했었다. 처음 읽었을 땐 시가 감성이 부족하고 놓인 글자들도 밋밋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래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 유념해 보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 스키장에 갔을 때 문득 이 시가 떠올랐다.
봄물이 불어나듯 나의 스키 실력도 조금 늘었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