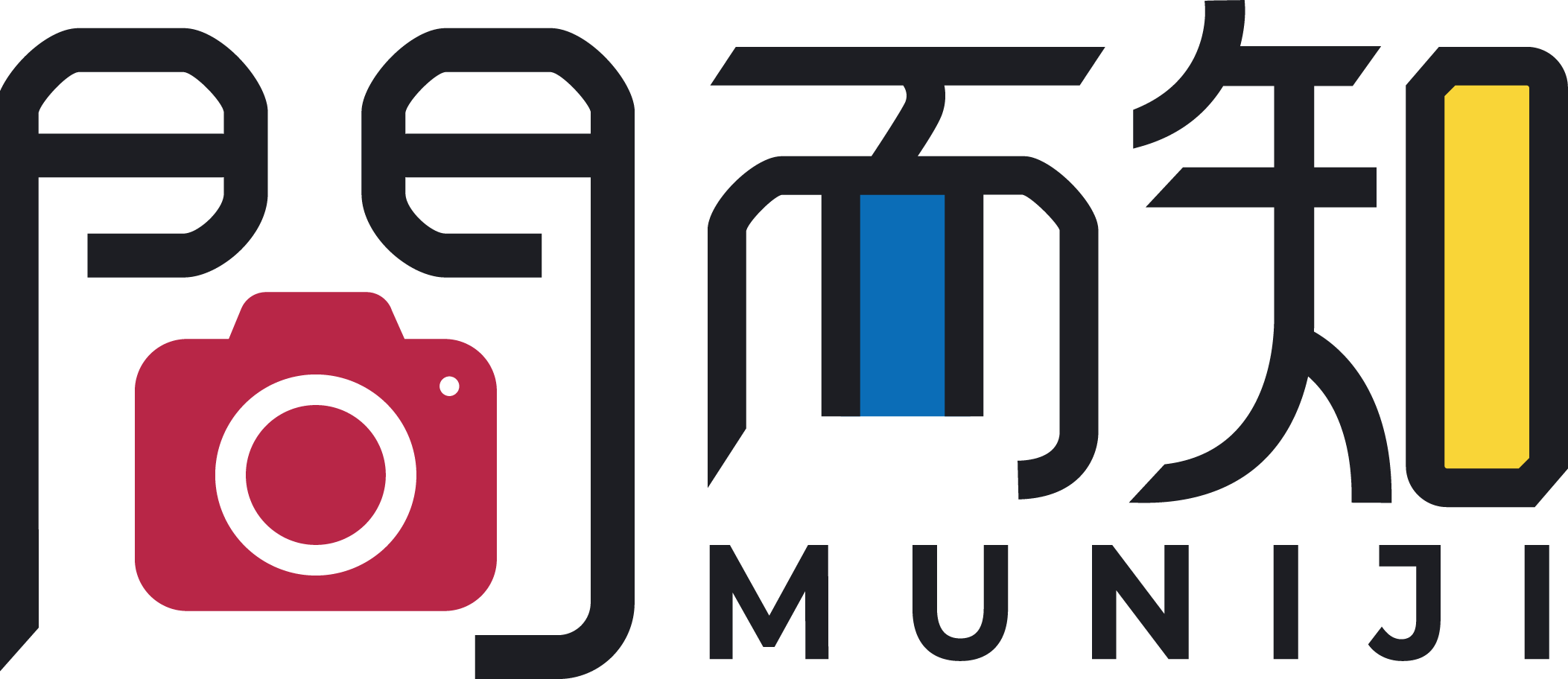번역원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첫 원고를 받았다. 마음으론 원고를 제대로 할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졸업을 하면 어떻게든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제껏 나는 무언가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껏 해본 일이라곤 불과 한 두 달에 불과한 단기 일거리들뿐이었지만 이젠 진짜 일을 하게 되니 믿기지 않았다. 놀라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직장인이 된 거 같았다.
나는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양을 받았는데, 이 원고를 교감표점하는 일이었다. 교감표점은 한문을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문장부호를 사용해서 표시해 주고, 글자들을 교감하는 작업이다. 다들 나누어 받은 원고들은 다양한 문체가 있었다. 그 중 나는 편지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정말 어려웠다. 공부할 때에는 모르면 넘어갔을 테지만 일로 받게 된 이상 모른 채로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틀리든 맞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었다.
교감표점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게 내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었다. 글의 내용을 알더라도 지침대로 올바르게 적용을 했는지, 내 의도는 이렇게 교감 또는 표점을 찍었는데 평가자가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지, 이곳에서는 이렇게 찍어야 할지 저렇게 찍어야 할지, 이 글자는 교감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 지 등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교점에 숙달치 못한 문제들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원고를 완성하고 다시 보는 원고는 수정할 것들이 넘쳐났다. 꼼꼼하지 못한 성격 탓인가 사소한 부분도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고 나면 아차차 싶어서 다시 수정하기도 하였다. 고리점에 신경쓰다보면 인명을 놓치기도 하고, 인명에 신경쓰다보면 따옴표를 놓치기도 하였다.
생각해보면 나는 성격이 꼼꼼치 못하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놓쳤던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원고를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볼 때부터 최대한 꼼꼼히 보되 다 보고 나서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면 꼼꼼치 못했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였다.
검토를 마치고 원고를 보니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우히히 이 종이 몇 장이 내 몇 달치 양식이라니. 정말 신기했다. 뭔가 부자가 된 거 같기도 하고, 앞으로 받을 원고료로 뭘 할지 생각하는 것도 재밌었다.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는 다시 원고를 보지는 않았다. 이미 떠나버린 원고에 수정할 부분을 발견해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좌전(左傳)》의 “서제막급(噬臍莫及)”과 《서경(書經)》의 “수회가추(雖悔可追)”가 아닐까?
원고가 끝나고 나니 다시 한적한 삶이 돌아왔다. 그러나 다음 원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시간이기도 하다. 교점은 아직 익숙지 않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심경(心經)》에 소동파(蘇東坡)가 어떤 이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언제 이 경자(敬字)를 타파할 수 있을꼬!〔何時打破這敬字〕”
봐도 봐도 헷갈리는 교점, 나는 언제 이 교점을 타파할 수 있을꼬!〔何時打破這校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