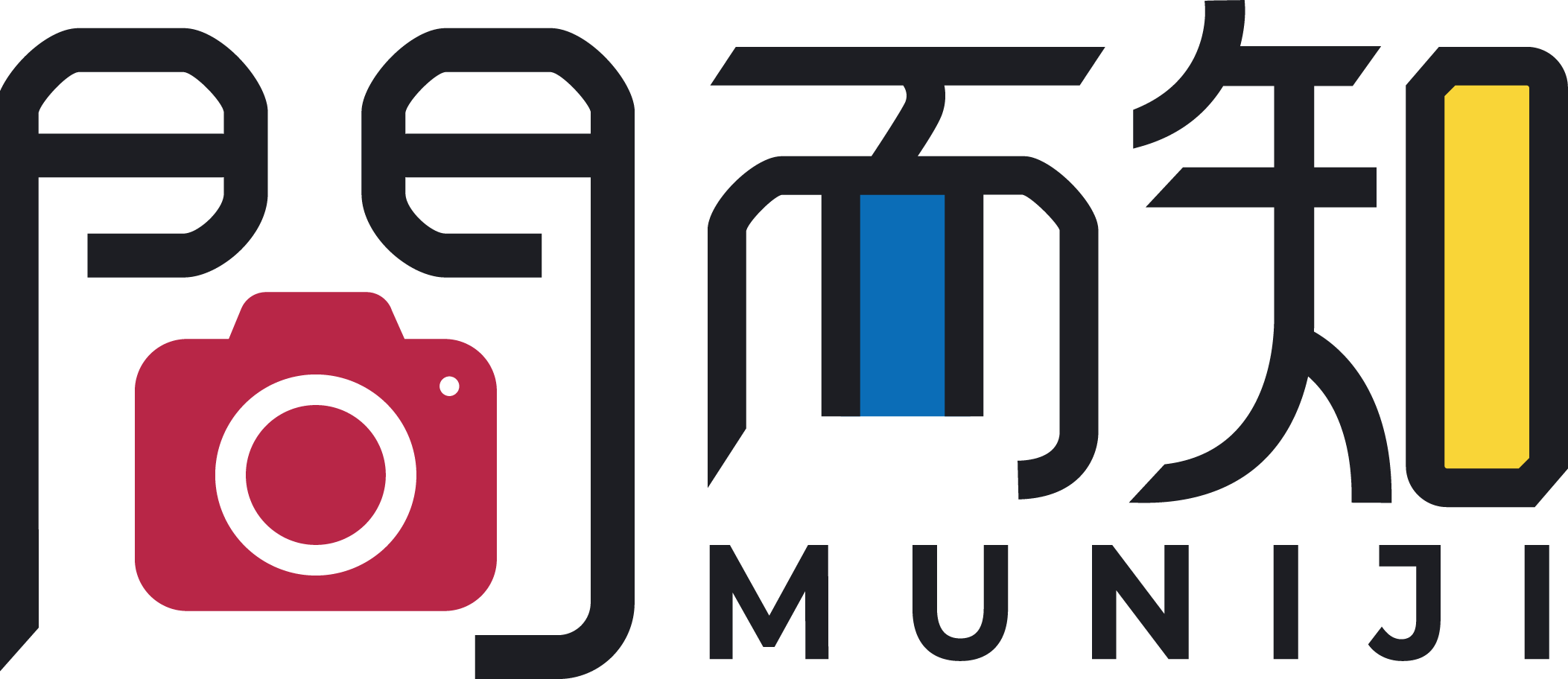누군가에게 나를 새로이 소개할 필요 없이 살았던 날들이 있었다. 태어난 뒤로 십여 년 남짓. 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딸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전교생이 채 40여 명도 되지 않던 분교(分校)가 읍내의 초등학교로 통합되기 전까지 나는 내 이름이 이토록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나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온 4학년 김광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래..? 김광..?”
“광명? 꼭 남자 이름 같다.”
“광명시 할 때, 광명…”
“아!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할 때, 그 광명?”
내 이름은 늘 그랬다. 결코 한 번에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가본 적도 없는 ‘광명시’를 들먹였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해야 될 때면 쭈뼛거리며 특이한 내 이름을 소개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3월, 문학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네가 광명(光明)이로구나! 출석부를 보면서 이름이 너무 예뻐서, 너를 가장 만나보고 싶었단다. 이름처럼 밝고! 환하고! 아름답구나!”
그날의 기억을 글로 적어보자니, 선생님의 우아한 몸짓과 달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월요일 아침이면 부리나케 학교로 달려가 선생님과 고전을 함께 읽거나, 시를 외거나, 언어영역 문제를 풀었다. 이름처럼,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한문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보았다. 그렇게 골똘히, 아니 스치듯 생각해 본 결과는 이렇다. 어쩌면, 한문(漢文)이라기보다는 한자(漢字) 풀이에 가까워 시시한 답변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저 찰나의 한 순간이 지금의 내가 한문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강렬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부르던 친구의 이름을, 사물의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풀이하고 되새겨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너의 이름엔 이런 뜻이 있어. 이런 뜻을 가진 네 이름, 참 멋지다.”
“이 지역에는 이런 유래(由來)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 지어졌구나.”
한자를 풀이해보면 비로소 알 수 있고,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문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감동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열일곱의 어느 날, 평소에도 익숙히 쓰고 듣던 나의 이름, 단 두 글자를 비로소 만났을 때입니다.’라고 대답할 테다.
* 광명(光明)하다
[형용사] 밝고 환하다. 또는 미래가 밝거나 희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