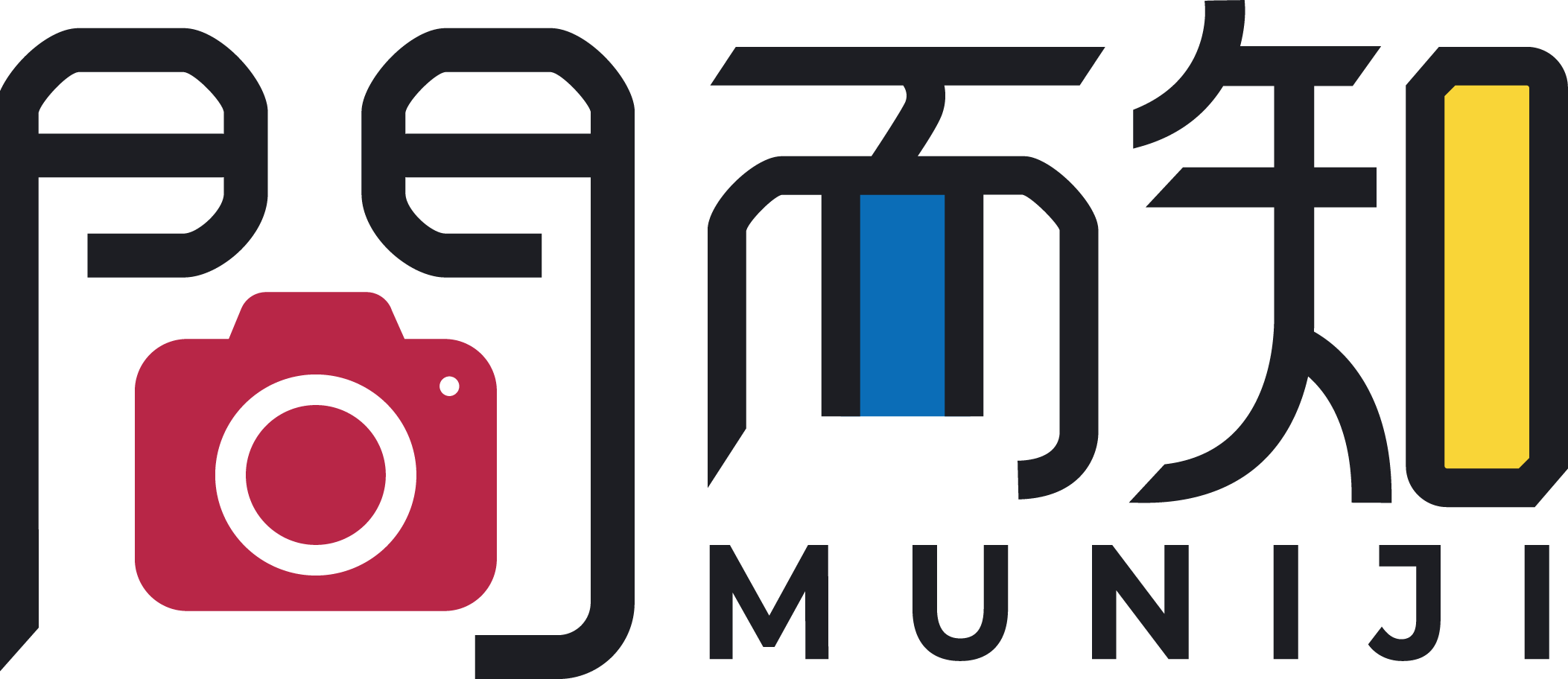국립현대미술관 소장전에서 만난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
만 스무살에 그린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1934년) 입선작이다.
정청(靜聽)
조용히 들음
미술관 전시를 가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작품 설명에서 한글을 보면 오히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영어를 봐야 뜻이 이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자를 병기하여 정청(靜聽)이라고 한들 靜과 聽의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고..
이럴 때는 ‘조용히 들음’ 이라고 뜻을 써 주는게 좋을까? 전시 관계자의 고심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다.
이 그림은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다가 6.25 전쟁통에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이후 1992년 일본의 소장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마이니치 신문이 기사화 하여 알려졌다고 한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어 이렇게 관람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입선 당시의 평론이 있어 살펴보니, 기교적인 측면은 훌륭하지만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 있는데, 다른 작품에 대한 평을 함께 읽어보니 이 평론가님이 좀 박하다. 스무살 청년이 이 정도 기교로 그린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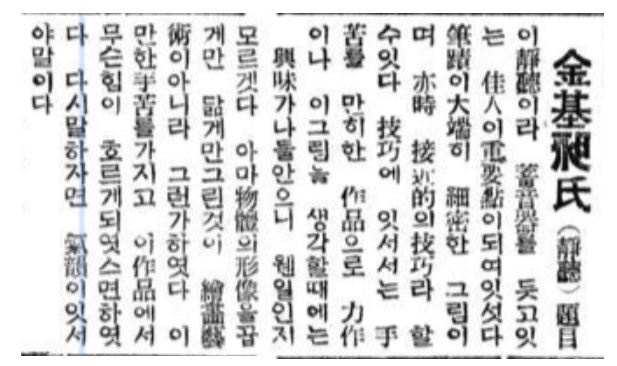
김기창씨(金基昶氏)
제목이 정청(靜聽)이라 축음기를 듣고 있는 가인이 중요점이 되어 있었다. 필적이 대단히 세밀한 그림이며, 역시 접근적의 기교라 할 수 있다. 기교에 있어서는 수고를 많이 한 작품으로 역작이나 이 그림을 생각할 때에는 흥미가 나질 않으니 웬일인지 모르겠다. 아마 물체의 형상을 곱게만 닯게만 그린 것이 회화예술이 아니라 그런가 하였다. 이만한 수고를 가지고 이 작품에서 무슨 힘이 흐르게 되었으면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운이 있어야 말이다. _조선일보 1934년 6월 8일 미전관감(美展觀感)
귀가 들리지 않았던 젊은 미술학도가 병약한 첫사랑 소녀와 여동생을 그렸고, 그 소녀는 입선 소식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스토리가 더해지면 한 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떤 의사의 집 응접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