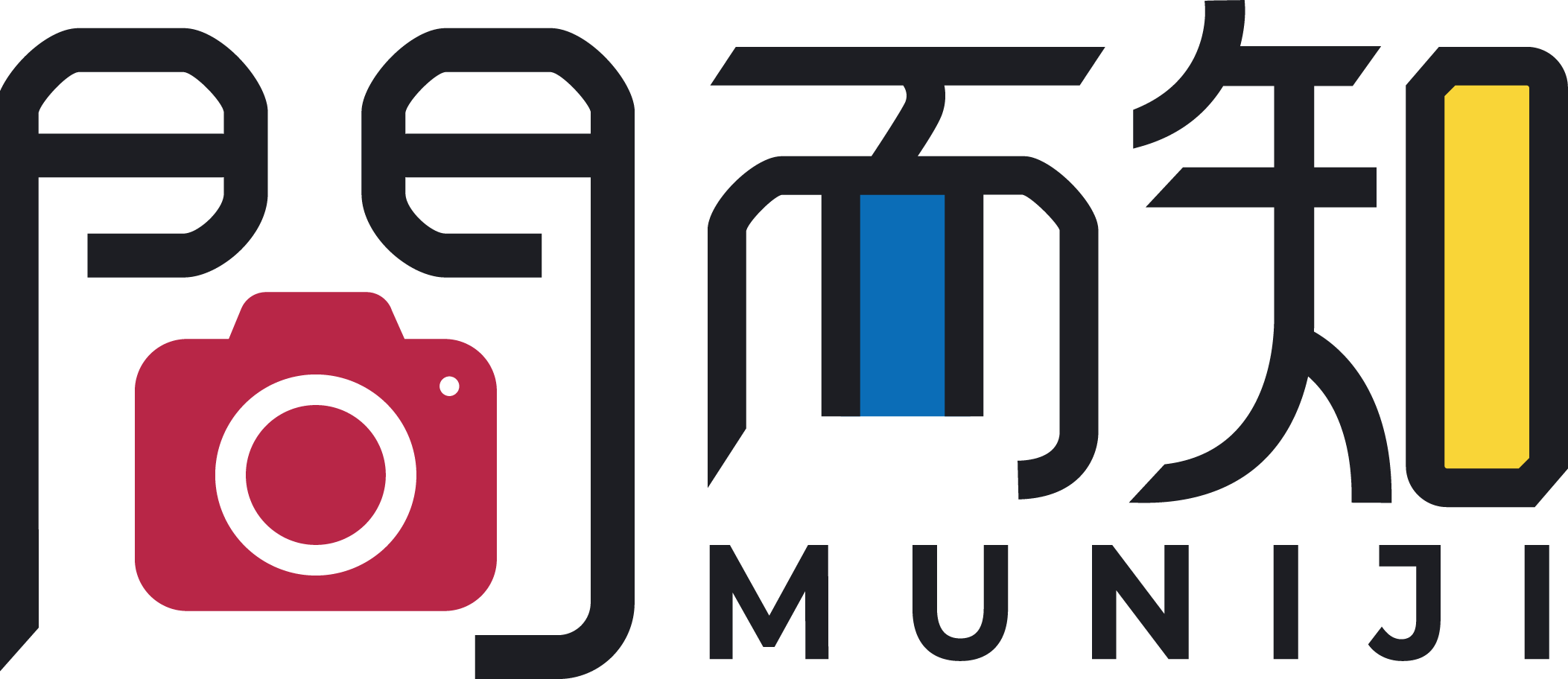이번 학기 기억에 남는 유행어는 아마 ‘이 사람아’ 가 될 듯 하다.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 아무래도 ‘이 사람아’ 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나와도 할 수 없죠.”
어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번역이 마땅치 않게 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 사람아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일갈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번역을 잘못한 우리가 들어 마땅한 일갈이었다- 그때 이후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아’를 듣지 말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자 유행어가 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주로 학생들이 번역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정을 받는데 이번 학기는 당나라 육지(陸贄, 754~805)의 글을 모은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와 《명청팔대가문초(明淸八大家文鈔)》 중 염정(濂亭) 장유쇠(張裕釗, 1823~1894)의 글을 읽었다. 이 중 《육선공주의》는 2019~2020년에 번역본이 나와서 영 막힐 때면 의지할 구석이 있기라도 하지만 《명청팔대가문초》는 아직 일부만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읽는 곳은 번역이 되어있지 않아 막히는 곳이 있으면 상상력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처음 발표 준비를 맡았을 때는 중국의 표점본을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바닥부터 헤매는 바람에 책 이름과 고유명사도 틀린 데다가 한문 투의 딱딱한 번역까지 지적을 받아서 정신이 몽롱할 지경이었다.
雖於今不可考나 然可以意而知也라
비록 지금 상고할 수는 없으나 유의하여 알 수 있다.
‘意而知’를 그냥 ‘알 수 있다’로만 풀자니 ‘意’를 빼먹은 듯하여 고심 끝에 ‘유의하여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무로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혹은 ‘뜻으로 짐작하여 알 수 있다.’처럼 뜻은 살리면서도 좀 더 풀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다. 사실 한문 투의 직역은 ‘올바른 번역’보다는 ‘틀리지 않는 번역’이 중요한 시험 대비용 습관이었으니 이젠 그런 습관을 버리고 ‘한글 연습’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전에는 이미 현토(懸吐)가 되어있는 글을 주로 보았는데 이젠 직접 토(吐)를 붙이면서 의미 구조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도 했다. 물론 현토가 오히려 뜻을 국한시키고 외국어를 익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가장 정확한 의미를 파악했다면 현토가 크게 다를 수 없다고 보는 쪽이라 현토를 직접 붙여보는 연습이 번역만큼 흥미로웠다.
과연 직접 단 토가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이 사람아’와 함께 자매품으로 따라오는 선생님의 걱정 어린 훈시(訓示) 세트를 피하기 위해서 학기 후반부에는 자신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서로 글을 묻고 살펴봐 주는 훈훈함이 있었다.
좋아하는 글귀 중에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不耻下問].”는 말이 있다. 물론 동기끼리는 “서로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不耻相問].”고 해야 더 잘 어울리겠지만. 생각보다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 보이며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아마도 같은 시험을 통과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공부하고 있다는 동질감과 함께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 이 시기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늘 당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조언 덕분에 서로의 마음이 더 쉽게 열렸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 번역과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나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며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생긴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고 난 후에 꼭 내 의견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경우를 종종 겪고 나서는 가능한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배워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많아 허투루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학기가 마무리 되고 준비해야 할 수업이 없어지니 왠지 더 침대 속이 포근한 듯 느껴지고, 굳은 결심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나와도 소파에서 책상까지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아무래도 게으름에서 나를 구원해 줄 동기들의 힘을 빌려야 후회하지 않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듯 하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공부해!’